자유기업원 “근로시간 단축보다 성과 중심 제도 개혁이 우선”
-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5-10-16 , EBN 산업경제
-
“정규직 과보호·경직된 제도…효율적 자원 배분 가로막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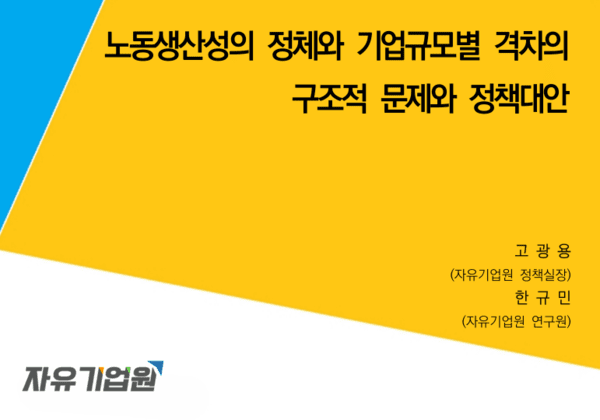
노동생산성 정체 및 기업규모별 격차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대 리포트 [출처=자유기업원]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시킨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보다 노동생산성 향상과 성과 중심의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자유기업원은 전날 발간한 '노동생산성 정체 및 기업규모별 격차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대안’ 리포트에서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OECD 평균의 70~80% 수준에 머물며 지난 10년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유기업원은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했지만 단위시간당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개선되지 않아 임금과 기업 경쟁력, 국가 성장잠재력 전반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생산성 정체의 원인으로 △노동시장 경직성과 제도적 비효율 △노동시간 의존 및 기술확산 한계 △중소기업 구조적 비효율 △서비스업 부진 △조직노조의 임금 왜곡 효과 등을 꼽았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혁신 역량 격차가 기업규모별 생산성 격차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6달러로 미국(97.0달러)·독일(93.7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리포트를 집필한 고광용 정책실장과 한규민 연구원은 “정규직 과보호와 경직된 인사제도는 효율적 자원배분을 가로막는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생산성과 고용의 질을 함께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계기업의 잔존을 방치하면 대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일자리 확대가 어렵다”며 “퇴출과 전환이 가능한 구조조정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원은 “정부는 '얼마나 덜 일할 것인가’보다 '같은 시간에 얼마나 더 잘 일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주 4.5일제 논의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성과와 효율을 높이는 제도 개혁의 문제”라며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과 시장의 역동성이 발휘되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이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개혁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